많이 달라진 삭막하고 씁쓸했던 봄 소풍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싼 김밥, 미지근한 사이다 한 병. 반별로 원을 그려 즐기는 수건돌리기, 장기자랑과 ‘백미’인 보물찾기 등 386세대 어른들이면 갖고 있을 이 같은 ‘국민학교’ 시절 봄·가을 소풍에 대한 추억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며칠 전,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학년별이 아닌 학급별로 가까운 공원이나 영화관람, 인근 박물관이나 야외 테마파크 등으로 1일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바뀌는 세월 따라 소풍에 대한 개념도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우리의 소풍장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공원으로 많이 갔습니다.
학교를 벗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업어가도 모르게 자곤 했지만, 소풍 전날은 새벽같이 일어나
'혹시 비가 오지 않나?'
밖으로 나와 손을 내밀곤 했으니까요.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훌쩍 떠날 수 있는 여행이기에 우리 아이들 이런 설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근에서 사 먹거나 도시락을 사 와서 먹고 있어 엄마의 정성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엄마가 싸 준 도시락을 들고 가 맛있게 먹고 오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은 돈만 주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24시간 김밥집도 있어 사서 오는 학생,
그냥 소풍지에서 라면을 먹는 학생,
엄마가 싸 주는 김밥 속에는 단무지와 시금치 몇 알이 전부였지만 썰지도 않고 둘둘 말아주는데도 왜 그렇게 맛있던지요.
소풍 때만 얻어먹을 수 있었던 삶은 달걀과 사이다,
먹거리 지천으로 늘린 우리 아이들이 이해나 할까요?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먹지 그랬어?"
요놈들아! 라면은 더 귀했단다!
체험학습장에서 장기자랑이나 보물찾기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 새싹이 돋아난 들길을 친구들과 손잡고 노래 부르며 걷는 재미, 낭만도 없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김밥에 사이다 먹고, 빙 둘러앉아 노래도 부르고 손수건 돌리기를 하고,
하이라이트인 보물찾기 시간. 부드러운 풀과 나무 사이에 보물 쪽지를 숨겨 놓고
와~ 흩어져 눈에 불을 켜고 함께 한 보물찾기는 또 얼마나 떨리고 마음 졸인 놀이였습니까?
어쩌다 선생님이 찍어주는 흑백사진 속에 담긴 우리의 모습.
어깨동무하며 찍은 사진 속의 친구들
벌써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있지요.
똑같이 교복을 입고 새까맣게 탄 시골 촌놈들,
한 셔터 안에 담은 단체 사진 뒤로 풍경만이 소품이 되었던 시절.
손에 쥔 핸드폰으로 꾹꾹 눌려 찍어 카스나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는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라 변화 속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소풍입니다.
소풍만 가면 선생님 도시락은 제 담당이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엄마가 정갈하게 담아주면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둘러앉아 젓가락 싸움을 해가며 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 학년 끼리 가게 되면 아예 학부모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도시락집이나 식당에 주문해 버리는 요즘입니다.
반장인 고3 아들 녀석, 남해 보리암으로 소풍을 갔지만, 담임선생님 도시락 싸준다고 해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가져가라!"
"선생님들 알아서 해결해! 뭐하러. 커피 한 잔 사 드릴게."
딸아이는 가지고 가서 선생님께 드리곤 했는데 아들이라 그런지 들고 갈 생각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친정동네 경상남도 수목원(반성 수목원)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역시 김밥을 사서 갔는데 정담임이신 선생님과 나무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현미밥, 상추, 케일, 오이고추, 들깻잎, 쌈장, 족발, 탁주 1병, 종이컵
철저한 준비를 해 오셔서 배낭 속에서 꺼내 놓습니다.
"와! 선생님 우린 김밥하고 방울토마토 밖에 준비 안 했는데."
"같이 나눠 먹으려고 많이 싸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마누라가요."
"정담임과 부담임이 이렇게 다르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해 가며 음식을 펴 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선생님! 요즘은 학부모들 선생님 도시락은 안 싸 보내나 봐요?"
"기대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 와서 먹음 됩니다."
".................."
학생들은 수목원 안에서 각자 친구들과 어울려 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만 신경 쓰면 되었습니다.
우리 7080세대는 갈 곳이 가까운 강가라도 좋았고,
누구 하나 시들해하거나 질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레고 행복한 하루의 소풍장소로, 늘 보는 흔한 곳이어도 우리는 얼마나 흐드러지게 행복했던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할까요?
나의 눈물 나게 그리운 시절을 이해는 할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렇게 씁쓸해지던지요.
'노을이의 작은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버이날 아들의 짧은 손 편지, 딸 생각 절로 난다! (31) | 2013.05.08 |
|---|---|
| 어버이날, 내 생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 (38) | 2013.05.08 |
|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경상남도 수목원' (25) | 2013.05.06 |
| 어린이날 시어머님께 받은 '내 생에 최고의 선물' (25) | 2013.05.05 |
| 식사 후 커피 한 잔, 득보다 실이 많다고? (17) | 2013.0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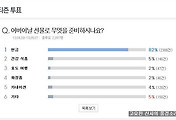


댓글